이영욱 연세대학교 교수(천문우주학과)는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고 알려졌으나 우리 연구에 따르면 우주는 20억 년~10억 년 전부터 감속팽창하고 있다"라며 "현재의 표준우주론 모형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이유로 진공 에너지를 상정하고, 그걸 우주상수(Λ)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우주상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영욱 교수는 11월 11일 기자와 만나 "우리 연구는 우주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초신성우주론이라는 방법론을 갖고 초신성 데이터를 새롭게 분석해서 얻은 것이며, 더구나 이 결과가 다른 우주론 방법론인 중입자음향진동(BAO)과¹ 우주배경복사에서 나온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신뢰도가 대단히 높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 현재 우주상수라고 하는 암흑 에너지는 우주상수가 아닌 걸로 나왔다. 암흑에너지는 여전히 있으나, 성질이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변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영욱 교수팀은 지난 11월 6일 영국 왕립천문학회(RAS)가 발행하는 천문학 학술지 MNRAS(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에 논문을 냈다. 논문은 이 교수 그룹이 '초신성 우주론에서 강한 모항성 나이 편향'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리즈 논문 세 개 중 두 번째 논문이다. 부제는 'DESI 중입자음향진동과의 일치 및 비-가속 우주의 징후'다.² 시리즈 논문을 관통하는 공통 제목 속의 '모항성'(progenitor)은 초신성으로 폭발한 별을 가리킨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이영욱 교수와 정철 연구교수이며, 제1저자는 손준혁 연구원(대학원 박사과정), 그리고 공동저자 중 한 명은 박승현 연구원(대학원 박사과정)이다. 세계 우주론학계를 흔들고 있는 논문의 상세한 내용과 함의를 묻기 위해 논문 저자들을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내 교수 휴게실에서 만났다.
이영욱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특히 201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의 공적인 '우주의 가속 팽창 및 우주상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교수팀은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웹사이트에 올린 설명 자료에서 "이 연구 결과가 향후 추가 검증을 통해 확정된다면, 1998년 암흑에너지 발견 이후 27년 만에 우주론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는 암흑에너지의 정체, 허블 텐션(hubble tension)³, 그리고 우주의 팽창 역사와 운명을 밝히는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우주론은 우주의 기원, 진화 및 미래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재의 표준우주론은 ΛCDM 모형(Lambda-cold dark matter model)이다. 여기서 그리스 문자 Λ(람다)는 '우주상수', CDM은 차가운 암흑물질을 뜻한다. 이영욱 교수팀은 논문에서 "(우리의)초신성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주는 'ΛCDM' 모형이 아니라, 'w_0w_a CDM'모형(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암흑에너지 상태방정식 모형)에 부합한다"면서 "w_0w_a CDM모형은 DESI(Dark Energy Spectroscopic Instrument, 암흑에너지 분광장비) 프로젝트가 근래에 제안한 우주론 모형이다"라고 말했다. DESI는 암흑에너지 정체를 밝히기 위해 우주3차원 지도를 만드는, 미국이 중심인 대규모 프로젝트다. 2021년에 공식적으로 관측을 시작했으며,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우주의 궁극적인 미래와 관련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 점으로 우주가 다시 수축하는 빅 크런치(Big Crunch)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표준우주론에 따른 주요 시나리오는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여 갈기갈기 찢어지는 대파열(Big Rip)이다.

해외 언론들 보도
이영욱 교수 팀 논문에 해외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영국을 대표하는 신문들인 가디언, 더타임스는 지난 6일 보도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5일 '우주팽창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우주론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Expanding Universe Study Teases Major Paradigm Shift in Cosmology)고 보도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 CNN, AP통신, 그리고 영국 BBC에서도 취재해갔다. 이 같은 상황은 이 교수팀이 5년 전에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냈을 때와는 다르다. 당시 해외 언론은 일부 과학매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반응이었다.
이영욱 교수는 이와 관련 기자에게 "이번에도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은 찻잔 밖으로 나왔다"면서 "이해 충돌 당사자인 노벨상 수상자 애덤 리스를 제외하면 우리의 논문 내용이 틀렸다고 반박하는 사람이 없다. 5년 전하고 다른 거는 제3자는 우리 편이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영욱 교수팀의 11월 6일자 논문의 제1저자인 손준혁 연구원은 국제 천문학계가 주시하는데 대해 "좀 무섭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이제 공격도 앞으로 많이 받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영욱 교수는 이와 관련 "무섭기도 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룹 미팅할 때 떠들던 소리를 지금 전 세상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한 이틀 쉬고 또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주 가속팽창과 감속팽창
이영욱 교수 팀 연구는 201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세 사람은 솔 펄머터(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브라이언 슈미트(호주국립대학교 교수), 애덤 리스(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다. 솔 펄머터는 1998년 발표된 논문을 생산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 Berkely) 팀을 이끌었고, 브라이언 슈미트는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소속이었다.
펄머터와 슈미트가 이끄는 두 팀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알고자 했던 과학적인 질문은, 빅뱅으로부터 138억 년이 지난 현재 우주는 어떤 상태일까였다. 즉 빅뱅으로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 팽창했는데, 여전히 팽창하고 있는지, 또 팽창할 경우에는 가속팽창이나 감속팽창이냐를 확인하고자 했다.
사람들은 우주가 여전히 팽창하기는 하나 팽창속도가 줄어드는 '감속 팽창'을 예상했으나, 두 팀은 '우주는 현재 가속 팽창 중이다'라는 같은 답을 내놓았다. 이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미국 동부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가 중심인 팀과, 미국 서부의 명문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팀이 동일한 답을 얻자 우주론학계는 '우주가속팽창' 모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기울었다. 결국 논문을 발표하고 13년이 지난 2011년 노벨재단은 노벨물리학상을 이들에게 안겼다. 이후 우주가속팽창에 기반한 우주론 표준 모형은 ΛCDM 모형으로 불리게 되었고, ΛCDM모형은 우주를 채우고 있는 에너지-물질은 세 가지라고 말했다. 즉 Λ(람다)는 우주상수(암흑에너지), CDM(차가운 암흑물질), 그리고 일반 물질이며, 이들은 각각 우주의 전체 에너지-물질량의 70%, 25%, 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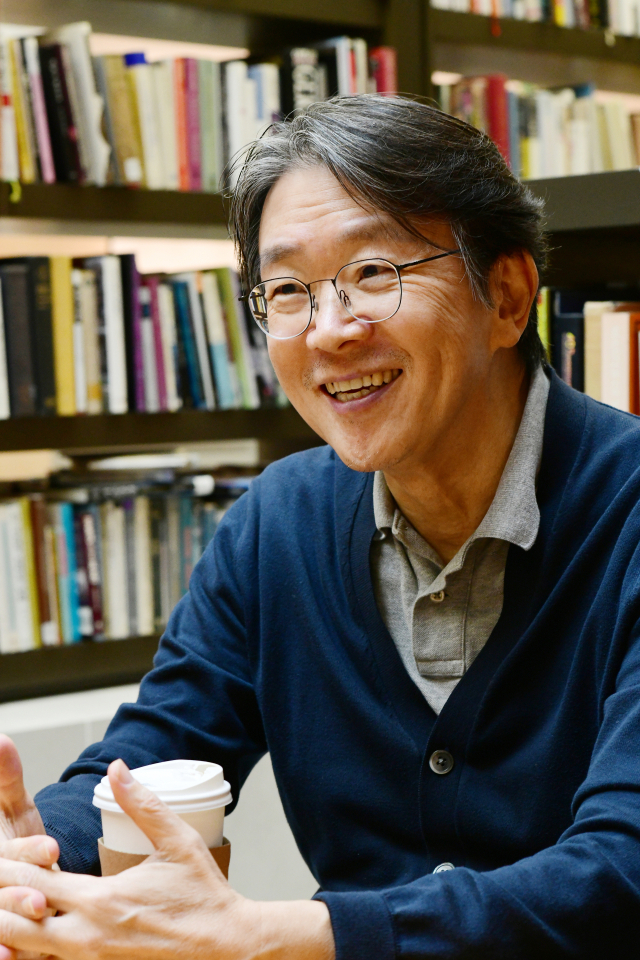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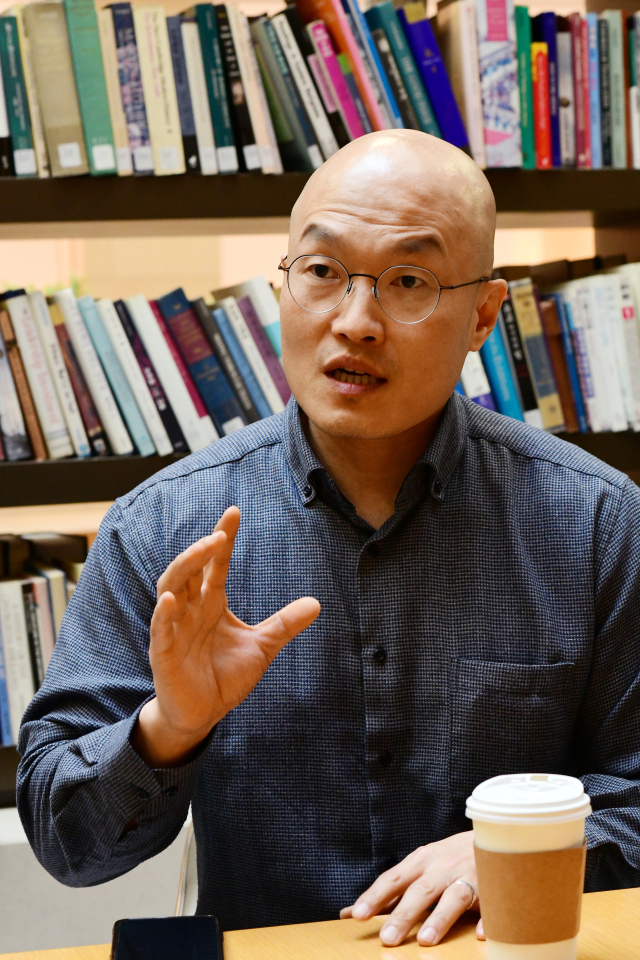
초신성 우주론
201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이 1998년 1월에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장소는 미국 천문학회(AAS) 학회장이었다. 워싱턴 D.C.의 힐튼호텔에서 열린 당시 학회에 이영욱 연세대 교수도 참석했다. 그는 당시 미국 NASA와 연세대학교, 그리고 프랑스 우주천문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자외선 우주망원경 갈렉스(GALEX) 프로젝트의 한국 측 책임자로 참여하고 있었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갔다. 홍보 부스 인근에 하버드 대학교 팀의 홍보 부스가 있었고, 이들이 우주론 판을 흔드는 발표를 우연히 보게 됐다. 이 교수는 "당시에 나는 GALEX 홍보에 힘을 쏟아야했기에 우주론 연구를 깊이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2011년 노벨상 수상자인 애덤 리스 등이 우주의 현 주소를 알기 위해 사용한 연구 방법론은 초신성 우주론이다. 초신성은 별이 대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우주 불꽃 쇼를 하는 초신성 중에 특정 초신성, 즉 1a형 초신성은 폭발 시 최대 밝기(절대 광도)가 일정하다고 알려져 있어, 천문학자는 1a형 초신성을 표준촛불이라고 부른다. 1a형은 우주의 거리를 재는 도구가 된다. 절대 밝기를 알고 있으니, 이 초신성이 밝고 어둡게 보인다면 그건 초신성이 우리로부터 가깝거나 멀리 있기 때문일 거다.
201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은 1a형 초신성의 최대 밝기가 일정하다는 전제로, 자신들이 각각 관측한 초신성 수십 개의 데이터를 각각 해석했고, 그 결과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신들이 본 초신성들이 생각보다 더 멀리 있었고, 이는 우주가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영욱 교수는 바로 이 부분이 잘못 된 거라고 주장해 왔다. 잘못된 초신성 우주론 방법론을 갖고 초신성 데이터를 해석하니, 우주가 가속팽창하고 있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착했다고 말한다.
초신성 거리 측정 어렵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은하는 변광성을 측정해서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변광성은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이고, 특히 세페이드 변광성은 밝기 변화 주기와 고유한 밝기 간에 상관 관계가 있어 이 특징을 이용해 관측자로부터 변광성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러나 1억 광년 이상 떨어진, 먼 곳에 있는 변광성의 거리를 측정하는 건 보이지 않아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주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천문학자에게는 새로운 '표준촛불'이 필요했고, 그 후보로 주목받은 게 초신성이다.
이영욱 교수에 따르면, 현대 우주론 역사에서 비트리스 틴슬리(1941-1981)가 유명하다. 뉴질랜드 출신 미국 천문학자이고 예일대학교에서 천문학 교수가 된 첫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틴슬리는 당시 표준촛불 후보 중 하나인 '거대 타원은하의 광도 진화 효과'라는 걸 강조했다. 이영욱 교수는 "광도진화효과는 먼 거리에 있는, 즉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우주에서 관측되는 표준촛불 천체의 평균적인 밝기가 현재 우주에서 보이는 표준촛불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라며 "먼 우주를 바라보면 그 시대의 별과 은하는 평균적으로 더 젊다. 티슬리 당시에도 타원은하의 나이 효과를 보정하긴 했는데, 지금처럼 항성 진화 이론이 발전하기 이전이어서 그걸 매우 과소평가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미국 천문학계의 거장은 앨런 샌디지였다. 샌디지는 윌슨산 천문대에서 우주 팽창을 발견한 에드윈 허블의 후임자다. 샌디지가 그 당시 표준촛불로 사용하던 거대 타원은하의 광도진화효과를 과소 평가했고,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한 첫 번째 사람이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대학원생이던 틴슬리였다. 이영욱 교수에 따르면, 틴슬리는 "앨런 샌디지가 광도진화 효과를 과소평가했고, 이를 제대로 보정하게 되면 우주론의 결론이 바뀐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사실은 1a형 초신성에도 적용되며, 우리 연구팀 분석에 의하면 젊은 은하에 속한 1a형 초신성은 광도를 표준화 이후에도 약간 더 어두운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틴슬리가 주류 이론에 도전했다가 8년 동안 고생했다. 결국 틴슬리가 옳다고 인정받았고, 그는 1976년 예일 대학교 부교수로 가게 된다. 거기에서 은하의 화학적 진화, 은하에 있는 항성 종족의 진화 관련 논문 등 주옥같은 논문들을 냈다"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이영욱 학생이 박사 공부를 위해 예일대학교에 도착한 건 1984년이다. 이때 비트리스 틴슬리 교수는 사망하고 없었다. 3년 전인 1981년에 암으로 숨졌다. 이 교수는 "틴슬리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201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이 1998년에 내놓은 우주가속팽창 이론이 좀 더 검증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당시부터 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GALEX가 2003년 성공적으로 우주로 올라가고, 관련 논문을 2007년, 2008년에 내면서 시간이 좀 생겼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그에게 "암흑 에너지가 뭐냐"라고 자꾸 물어오면서, 우주론을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교수는 "나는 구상성단 분야에서는 나름 유명한데, 2008년 여름에는 국제학회에서 초청강연 의뢰가 없었다. 그래서 초신성우주론의 문제를 조사해보자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해 여름 초신성 우주론 관련 논문을 100여 편 읽었다. 그리고는 역시나 "초신성의 광도 진화가 없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광도 진화가 없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201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이 이야기한대로) 가속팽창과 우주상수로 연결시킬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도 '가속팽창과 우주상수' 우주론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건 잘못됐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를 박사과정학생이던 강이정, 김영로 연구원, 그리고 정철 박사와 시작했다.
한국 천문학회 최초의 '네이처' 논문
정철 연구교수는 "우리 그룹이 구상성단과 타원은하의 나이 측정에서는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한다. 2등이라면 섭섭하다"라고 말했다. 초신성 우주론이라는 이영욱 교수팀의 연구가, 뒤돌아보면 구상성단의 나이 측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이영욱 교수팀의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가 1999년 네이처 논문이다. 네이처는 최상위 과학학술지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한국천문학회 최초의 '네이처' 논문이다. 연세대학교 최초의 네이처 논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논문 제목은 '병합 사건의 흔적을 보여주는 오메가 센타우리 구상성단의 다중 항성종족'(Multiple Stellar Populations in the Globular Cluster ω Centauri as Tracers of a Merger Event)이다.
구상성단은 공 모양을 이루는, 많으면 100만개까지 별들의 집단이다. 우리은하에도 150개 정도의 구상성단이 있고, 이중 가장 큰 건 센타우루스 자리 오메가(Omega Centauri, NGC 5139)다.
이영욱 교수는 "우리 팀이 오메가 센타우리에서 다중 항성 종족을 발견한 거다"라며 "그때까지의 지구과학 교과서는 성단이 한 가지 종족으로만 돼 있다고 했다. 우리 논문은 그런 게 아니며, 다양한 항성 종족이 들어 있다는 걸 최초로 밝혔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항성 종족으로 구성되었다는 건, 오메가 센타우리 구상 성단이 한 번에 형성된 단일 집단이 아니라는 얘기다. 오메가 센타우리 구상 성단은 과거에 왜소은하(dwarf galaxy)의 중심핵이었다. 왜소은하가 우리은하에 합병되었고, 합병 과정에서 왜소은하 외곽의 별들은 중력에 의해 찢겨져 나갔고, 중심핵만 오늘날 구상성단으로 남아 있다.
이 교수는 "우리은하는 처음에 작은 은하로 시작했고, 왜소은하들을 합병하면서 점차 몸집이 커졌다. 그걸 설명하는 이론을 '계층적 은하합병이론'이라고 한다.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오메가 센타우리 구상성단 안에 다중 항성 종족, 즉 형성 시기가 다른 여러 세대의 항성 종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이 교수가 나이와 화학 조성이 다양한 별들이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남다른 지식과 통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이영욱 교수가 "나이를 측정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욱 교수는 2008년을 전후해 박사과정생이던 정철 연구교수, 정 연구교수 후배인 강이정 박사(현 미국 스팬퍼드 대학교 SLAC 연구원), 김영로 박사와 함께 초신성이 폭발한 은하(초신성 호스트 은하)의 '나이'를 측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강이정 김영로 당시 석사과정 학생은 칠레와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천문대에 가서 관측을 했다. 정철 박사과정학생은 후배들이 갖고 온 데이터를 사용해서 초신성 호스트은하의 나이 측정을 했다. 정철 연구교수는 "우리는 초신성의 밝기와 그 초신성이 속한 은하의 나이와 관련성이 상당히 깊다는 걸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초신성 데이터로만은 설득시키지 못하다"
정철 연구교수는 "우리 팀이 제1a형 초신성의 밝기가 나이와 관련성이 깊다는 걸 알아낸 뒤 세계 여러 곳에서 열린 학회에 가서 연구 결과를 홍보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들이 뭔가 잘못한 거다'라거나, 혹은 '초신성 데이터만 그렇지 않느냐. 다른 우주론 결과와는 들어맞지 않지 않는다'는 식의 피드백을 많이 줬다"라고 말했다. 표준 모형으로 자리잡은 '우주가속팽창'모형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이 교수 그룹의 새로운 초신성 우주론 연구를 믿으려는 사람이 적었다.
정철 연구교수는 "제1a형 초신성의 광도 진화효과를 보정하면 멀리 있는 젊은 은하에 속한 초신성의 밝기가 이전에 알고 있는 것보다 밝아진다. 이를 감안하지 않은 사람들의 우주 공간 팽창 속도 연구 결과는 틀린 거다. 기존 우주론 모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2019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이 교수를 취재한 건 2019년이다. 그때 이 교수는 '광도 진화 효과'를 얘기하면서 201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은 틀렸다고 얘기했고, 당시 연구 결과는 2020년 미국 천문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APJ(The Astrophysical Journal)에 나왔다. 그 뒤에도 이 교수 그룹은 꾸준히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를 확충하고 논문을 발표했다.
시리즈 논문 세 개 준비
이영욱 교수 그룹은 영국 왕립천문학회(RAS)가 발행하는 천문학 학술지 MNRAS에 올해 '초신성 우주론에서의 강한 모항성 나이 편향'라는 제목으로 세 개의 시리즈 논문을 내고 있으며, 그 첫 번째가 지난 4월에 나갔다. 정철 연구교수가 제1저자이고, 논문 제목은 '보다 넓은 적색편이 범위에 있고, 더 많은 호스트 은하 샘플에서 얻은 강력하고 도처에서 발견되는 증거'(Robust and ubiquitous evidence from a larger sample of host galaxies in a broader red shift range)다.
4월 논문의 내용은 이영욱 교수팀이 지난 11월 7일에 낸 연구 설명 자료에 잘 나와 있다. 인용해 본다. "오랫동안 우주의 '표준촛불(standard candle)'로 사용돼 온 Ia형 초신성이 폭발을 일으킨 항성의 나이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 젊은 항성에서 발생한 초신성은 광도 표준화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어둡고, 나이 든 항성에서 기원한 초신성은 더 밝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약 300개의 초신성 호스트(숙주) 은하 샘플을 이용해 이 효과를 5.5시그마(99.9999999%)의 높은 통계적 신뢰도로 검증했다. 이는 먼 은하에서 초신성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 단순한 우주론적 효과만이 아니라 항성천체물리학적 요인에도 기인함을 의미한다. 연구팀이 이 효과를 반영해 초신성 데이터를 보정하자, 암흑에너지가 우주상수의 형태로 존재하는 기존의 표준우주모형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11월 6일에 나온 논문은 두 번째 논문이며, 세 번째 논문은 박승현 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다.
다른 우주론 데이터와 아구가 맞아 떨어진다
이영욱 교수는 "초신성 얘기만 하면, 우리의 연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DESI 중입자 음향 진동(Baryon acoustic oscillations)하고 우주배경복사(CMB)와, 우리의 초신성 우주론 연구 결과가 똑같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DESI는 미국 애리조나 주 투산 인근에 있는 키트 피크(Kitt Peak) 국립천문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DESI는 특히 중입자음향진동(BAO)을 사용하여 우주 팽창의 역사를 측정하며, 2024년 4월과 2025년 5월에 각각 관련 측정 데이터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우주배경복사 자료는 2021년에 플랑크 우주망원경에서 나온 거라고 했다.
이영욱 팀이 수행한 초신성의 나이 효과 연구와, DESI BAO 데이터(DR1, DR2)가 들어맞는다는 걸 알아낸 건 11월 논문의 제1저자인 손준혁 연구원이고, 시기는 2024년 4월 DESI BAO 데이터(DR1) 공개 전이었다. 손 연구원은 "우리의 초신성 우주론 분석과, BAO 데이터, 그리고 우주배경복사 자료가 딱 들어맞는다는 걸 안 건 2023년 말이었다. DESI BAO 데이터가 나오기 약 5개월 전이었다. SDSS(Sloan Digital Sky Survey, 슬론 디지털 전천탐사) 데이터라는 게 있다. 그걸 보니 모든 게 들어맞았다"라고 말했다. 이걸 이영욱 교수 연구실 미팅 때 손준혁 연구원이 발표했다. 손 연구원에 따르면 그때만 해도 SDSS에 기반해 논문으로 만들 자신이 없었고, 이영욱 교수도 '위험하다. 부담스럽다'라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5개월 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학회에 이영욱 교수와 정철 연구교수가 초청받아 갔다. 영국 왕립학회가 주최하는 '표준우주모형에 도전하다'라는 학회이고 조직한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 수비어 사카르(Subir Sarkar) 교수였다. 여러 나라의 천문학자 200 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DESI의 BAO 데이터를 공개 장면을 접했다. DESI측은 런던 학회에서 "암흑 에너지 밀도가 지난 45억 년 동안 10%씩 약해졌다는 걸 확인했다"라며 "이번 분석대로라면 우주 팽창 가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표준 모형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DESI는 이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암흑에너지 모형이 표준우주모형보다 관측자료를 더 잘 설명한다"라고 말했다. BAO데이터는 표준우주모형을 흔드는 내용이었다.
이영욱 교수는 DESI의 발표 슬라이드에 나온 그림 한 장을 보는 순간 옆에 있던 정철 교수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본 거잖아. 손준혁 연구원이 랩 미팅에서 발표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귀국하자마자 손 연구원에게 후속연구를 지시했고, 손 연구원은 2024년 4월에 나온 DR1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시작했다. 초신성 우주론 분석, BAO데이터, 우주배경복사 데이터가 다 깔끔하게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4월 DR2 데이터가 나오자 이걸 갖고 논문을 마무리, 11월에 출판할 수 있었다.
정철 연구교수는 이와 관련 "통상 우주론 연구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사용하면 통계적 유의미성이 작다. 하나의 방법론만으로 우주를 정확히 기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신성우주론으로 연구한 걸 다른 우주론 연구방법론과 합한다"면서 "세 가지 우주론 방법론을 합한 우리의 연구 결과는 손준혁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다시 조화( concordance)를 이루는 우주 모형이 되는 거다. 새로운 조화 모델을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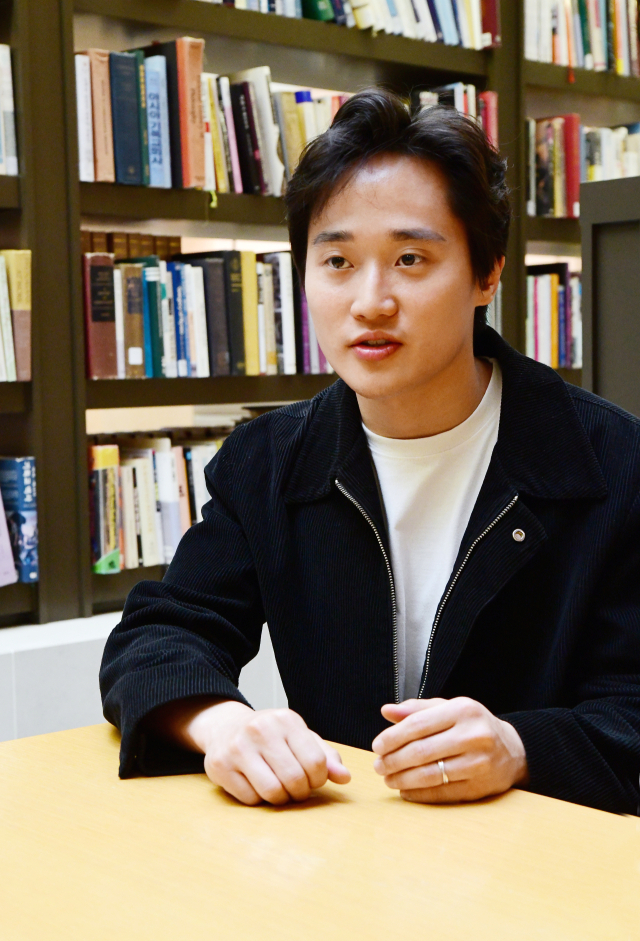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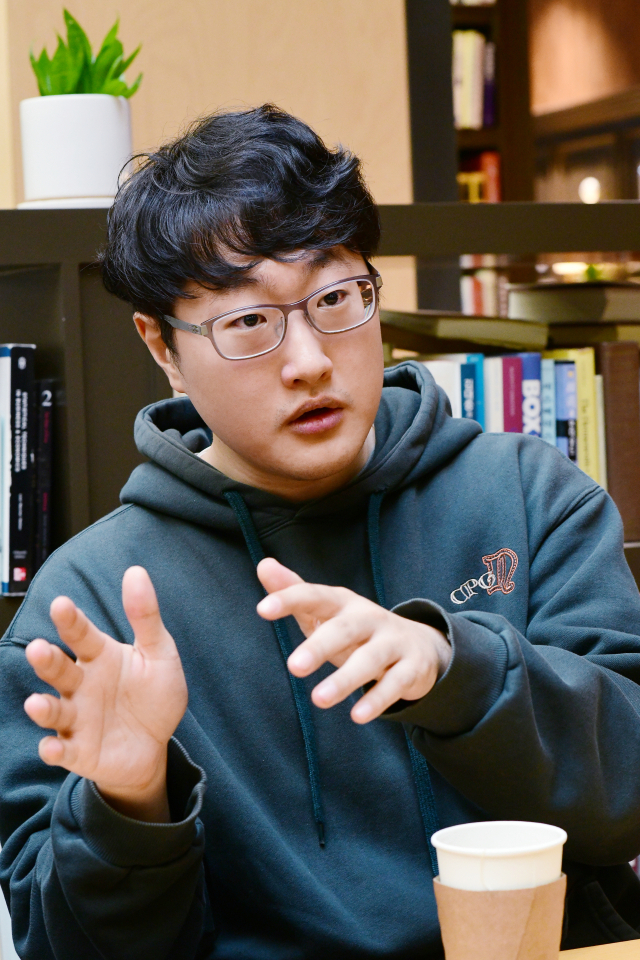
"DESI는 잘못된 초신성 우주론 데이터로 해석했다"
이영욱 교수는 DESI가 기존 표준우주론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게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DESI는 초신성의 광도진화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기존 데이터에 기반해 지난 4월에 BAO데이터를 공개했고, 그러니 잘못된 해석을 내놓았다"라고 말했다. 당시 DESI는 현재 우주는 가속팽창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감속팽창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욱 교수팀이 내놓은 초신성의 나이 효과를 감안하면 우주는 이미 감속팽창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감속팽창이 시작된 시기에 대해 "우리 결과에 따르면 한 17억 년 전 쯤 감속 팽창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이영욱 교수 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시리즈 논문의 마지막 논문은 박승현 연구원이 제1저자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이와 관련 "초신성 연구자 사이에 오래된 난제가 하나 있다"라며 "그동안 1a형 초신성을 표준촛불로 만들기 위해 수행해 왔던 은하 질량에 따른 밝기 변화 보정은 잘못 됐다.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나이에 따라 보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이에 따른 광도 변화가 질량이나 별 형성률에 따른 밝기 변화를 전부 다 유도해내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영욱 교수는 "이게 일반인에게는 별 관심이 없겠지만 두 번째 논문의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우주상수와 암흑에너지
이영욱 교수는 우주상수는 없고, 암흑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하는 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재의 표준우주론(ΛCDM 모형)은 우주상수가 암흑에너지라고 하고 있으니,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주상수가 없다면 암흑에너지도 같이 사라져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새로운 우주론 모델 즉, w_0w_a CDM모형에 암흑에너지가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w_0w_a CDM모형이 무엇인가? 먼저 우주상수부터 살펴보자.
우주상수는 1917년 아인슈타인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개발한 뒤에 이를 우주론에 도입했고, 그 결과 우주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인 걸로 나온다는 걸 알았다.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당시 사람들은 우주는 정적이라고 생각 했고, 그러니 동적인 우주 모델은 옳지 않다고 봤다.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하고 수축한다는 동적인 우주 모델을 정적인 모델을 바꿔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우주상수를 자신의 수식에 집어넣었다. 우주상수라는 게 뭔지 모르나, 우주를 정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반중력 개념의 수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12년 뒤인 1929년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LA인근 패서디나에 있는 윌슨 산 천문대에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관측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는 불필요했고, 천문학자들은 우주상수를 우주론 창고에 집어넣었다.
우주상수가 부활한 건 70년 가까이 지나서다. 201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가 포함된 두 그룹이 '우주가 가속팽창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우주가속팽창의 원인으로 미지의 에너지를 떠올렸고, 우주상수가 되살아났다. 이때 우주상수는 시공간 자체의 진공에너지이다. 공간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가진다면, 이로 인해 우주 팽창은 가속화한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 정도 지나 이영욱 교수 그룹이 "우주상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암흑에너지는 왜 우주상수와 함께 사라지지 않나? 이 교수는 이와 관련 "암흑에너지는 있다. 다만 암흑에너지 상태방정식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걸로 나왔다. 불변의 밀도를 갖고 있는 우주상수가 아니다. 과거에는 압력이 셌다가 지금은 매우 약해져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에는 우주상수가 암흑에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주상수는 없고 그래도 암흑에너지는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암흑에너지 상태방정식이라는 게 있다. 암흑에너지의 압력(P)과 에너지 밀도(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둘의 관계는 매개변수 w(더블유)로 표현한다(w=P/ρ). 이때 암흑 에너지 밀도(ρ)는 우주 전체의 물질-에너지 중에서 암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표준우주론은 암흑에너지 밀도가 약 70%라고 본다. 중요한 건 w=P/ρ에서, w값이다. 지금까지는 w값이 –1인 줄 알고 있다. w는 변하지 않는 상수였다. 그런데 달라졌다.
이영욱 교수는 "우리가 조사해 보니, w값이 과거에는 –2였다가 지금은 –0.4 근처에 와 있다"라며 "w가 줄어드는 변화율이 굉장히 가파르다. 빅뱅 직후에 비하면 훨씬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과학자들은 상태 방정식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일반인들한테는 암흑 에너지가 성질이 변했고 약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우주모델
이영욱 교수 그룹이 지지하는 새로운 우주론 모형은 w_0w_a CDM모형이다. 20여년 전후에 표준우주론에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 제안했고, 지난 4월 DESI 그룹이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연구 결과는 w_0w_a CDM모형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다. w_0w_a CDM에서 w_0은 현재 시점의 상태 방정식 값이고, w_a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 즉 w가 과거로 갈수록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변화율이다. 현재 표준우주론에 따르면 암흑에너지가 우주상수이니 w_0=-1, w_a=0이나, 시간에 따라 암흑에너지의 성질이 변하는 모델에서는 w_a≠0이 아니다.
이영욱 교수팀은 분주해 보였다. 이 교수는 인터뷰가 길어지자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는 "백마고지 전투를 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론의 주류이론에 도전하는 싸움은 지극히 어려우며,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문은 과거 논문 발표 때와는 달리 국제 천문학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그는 힘을 얻고 있다. 이영욱 교수는 "다음 주에 열리는 입자물리 학회에 초청강연을 요청 받았다. 물리학자들이 우리 연구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손준혁-박승현 연구원은 학과 규정을 만족하면 내년에는 박사학위를 받을 거라고 했다. 이 교수가 내년 8월에 65세 정년을 맞을 예정이어서, 그전에 학위를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백마고지로 향하는 네 사람을 응원하며, 기자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고
1. 중입자 음향 진동(BAO,Baryon Acoustic Oscillations): 빅뱅 이후 수십만 년 동안 우주는 물질과 빛으로 이루어진 뜨겁고 걸쭉한 수프였다. 중력은 물질을 안으로 끌어당겼고, 빛은 물질을 밖으로 밀어냈다. 이런 밀고 당기는 싸움으로 수프 속 초기 밀도가 높은 지점들에서 밀도 잔물결이 생겨 퍼져나갔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차 식고 원자가 형성되자, 우주는 투명해졌다. 빛이 흘러나와 바리온 음향 진동(BAO)이라고 불리는 잔물결을 그 자리에 얼려 뒀다.
BAO가 얼기 전에 이동할 수 있었던 거리는 약 10억 광년이다. 이 거리에는 밀도가 더 높은 껍질을 가진 일련의 겹쳐진 구체가 생겼다. 밀도 높은 껍질들은 다른 지역보다 약간 더 많은 은하를 형성했고, DESI 연구원들은 수백만 개의 은하를 지도로 만들 때 이러한 구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까운 구체는 먼 구체보다 더 크게 보이지만, 모든 구체 크기는 같다. 이 때문에 BAO는 우주의 거리를 재는 '표준자'라고 불린다.
2. 이영욱 교수 그룹은 시리즈 논문 세 개를 낼 예정이다. 논문의 공통 제목은 'Strong progenitor age bias in supernova cosmology'이다. 지난 4월에 첫 번째 논문이, 이후 7개월이 지난 11월에 두 번째 논문이 나왔다. 세 번째 논문은 준비 중이다.
4월 논문: Chul Chung, Seunghyun Park, Junhyuk Son, Hyejeon Cho, Young-Wook Lee, "Strong progenitor age bias in supernova cosmology – I. Robust and ubiquitous evidence from a larger sample of host galaxies in a broader redshift range", 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 Volume 538, Issue 4, April 2025, Pages 3340–3350.
11월 6일 논문: Junhyuk Son, Young-Wook Lee, Chul Chung, Seunghyun Park, Hyejeon Cho, "Strong progenitor age bias in supernova cosmology – II. Alignment with DESI BAO and signs of a non-accelerating universe", 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 Volume 544, Issue 1, November 2025, Pages 975–987.
3. 허블 텐션(hubble tension)은 우주 팽창 속도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우주 팽창 속도인 허블상수 가 우주배경복사(CMB)를 관측하여 나온 값은 약 67km/s/Mpc이나, 초신성과 같은 표준촛불을 이용하여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직접 측정한 값은 약 73km/s/Mpc이 나온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