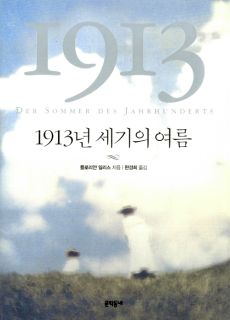
|
| ▲ <1913년 세기의 여름>(플로리안 일리스 지음. 한경희 옮김, 문학동네 펴냄). ⓒ문학동네 |
바로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1913년 세기의 여름>(한경희 옮김, 문학동네 펴냄)의 저자 플로리안 일리스다. 이 말 하나로 일리스는 당대에 가장 성공한 카피라이터의 반열에 올랐다.
일리스는 대학에서 미술사와 근대사를 전공하고 미술 저널리즘과 미술 경매의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며, 지금도 독일의 유력 주간지 <디 차이트>의 문예란을 이끌고 있다. 대학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도이체 방크 이사의 딸과 결혼한 그는 상류사회의 문화에도 익숙하다. 이런 그가 작년에 발표한 <1913년 세기의 여름>에서 예술계와 상류사회의 움직임을 주로 보고하는 것은 전혀 의외가 아니다.
<1913년 세기의 여름>은 1913년의 연대기를,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문화 연대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촘촘하게 기술하는 책이다. 일리스는 왜 하필 1913년을 선택했을까? 왜 역사 기록에서 1913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933년이나 1945년 혹은 1968년이나 1989년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미술 전문가 혹은 좀 더 넓혀 말하자면 예술 전문가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13년은 물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의 시기이기는 하지만 또한 유럽의 현대 예술사에서 찬란한 이름을 남긴 이들이 득실거리고 현대 예술의 온갖 조류들이 뒤엉켜 꿈틀거리고 발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책의 맨 끝에 실린,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목록을 보아도 20쪽이 넘는다. 한마디로 거물급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이 뮌헨에서, 베를린과 빈에서, 파리에서 발에 차인다. 아마도 일리스는 1913년이 이렇게 예술의 용광로 같은 시기였다는 데에서 이 시기에 이끌렸을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소묘를 만날 수는 없다. 대중과 정치, 경제는 그저 변두리에서 찔끔 다루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역사책으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가 그런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니, 이런 점을 이 책의 결함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책은 굳이 분류하자면 문화사 칸에 꽂히는 게 적당할 듯하다. 저자가 독일인이다 보니 세계 전체의 이런저런 사건들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독일어권 지역들의 문화계에 대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일리스는 '골프 세대'의 명명자답게 이 책에서도 경쾌하고 유쾌하며 위트 있는 필체를 발산하고 있다. 짧은 일화들 끝에는 빈번하게 반전과 해학이 풍부한 멘트들이 자리 잡고 있다. 때로는 웃음 포인트를 잡아내려는 노력이 저자의 강박적인 버릇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필치는 읽는 즐거움을 대단하게 키워준다.
소개되는 일화들은 매우 흥미롭다. 문학사나 미술사에 정통한 사람이라도 일리스가 소개하는 일화들을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도 저자는 이런 일화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구성해내기 위해 출판된 작품과 편지와 일기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문서보관소들까지 뒤졌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뒤져 모은 단편들을 소화하여 그럴듯한 콜라주로 엮어내고, 이 책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뜻밖의 조합들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흔치 않은 부지런함과 끈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JPG)
|
| ▲ 에곤 실레의 그림 <우정>. ⓒ(출처 Wikimedia Commons) |
스탈린과 히틀러, 그리고 티토는 한때 빈에서 같은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산책하던 공원에서 서로 지나치며 모자를 들고 인사를 나누었을지도 모른다. 스탈린이 공산주의자 니콜라이 부하린을 평생 증오한 것은 자신이 유혹하다가 실패한 보모를 부하린이 유혹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쇤베르크는 전위적인 작품을 발표했다가 따귀를 얻어맞고, 카프카는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그녀와 결혼하면 잠자리를 요구받고 같이 시간을 보내느라 글을 못 쓰게 될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헤르만 헤세의 경우에도 글쓰기의 원동력은 아내와의 부부싸움이다. 싸움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 글쓰기에 몰두하던 그 또한 예술가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고 단언한다.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가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것은 한 차례 도둑을 맞았기 때문이었다. 프로이트가 <토템과 타부>를 쓴 것은 제자 융이 자신을 치받는 것이 부친살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JPG)
|
| ▲ <카프카의 편지>(프란츠 카프카 지음, 권세훈·변난수 옮김, 솔출판사 펴냄). ⓒ솔출판사 |
일리스가 그려내는 일들은 마치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듯하다. 여러 인물들의 전면에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일들, 소소하지만 인물의 본연의 모습을 더 잘 알게 해주는 일상들을 통해 어쩌면 그들의 빛나는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지름길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미술 전문가답게 일리스가 내놓는 미술작품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들을만하다. 예컨대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가 그린 여성의 육체를 대비시키는 대목은 정확하고 예리하며 정선된 언어들로 충만하다.
번역은 매우 좋다. 무수한 인명과 지명, 당대 문화의 독특하고 사소한 사항들, 전문적인 예술 용어들, 필치가 다양한 사신(私信)들이 난무하는 이 책을 번역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역자는 이런 난관들을 훌륭하게 극복해낸 것으로 보인다. 유겐트슈틸을 청년양식이라고 번역한 것도 신선하고 적절하다. 역자는 심지어 저자의 사소한 실수까지 잡아내어, 예컨대 저자가 하인리히 만의 생일을 착각한 것까지 역주에 기록해놓았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정확한 번역 덕택에 우리는 온갖 인물과 사건들로 촘촘하게 얽혀있는 이 책을 한결 더 즐겁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