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존중', '소득'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생각의힘 펴냄)에서 꼽은 '좋은 일자리'의 세 가지 조건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는가, 적절한 '소득'을 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자리'라고 했다.
노동경제학이 전공인 저자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ILO에서 노동시간, 임금, 고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펴낸 책에서 조금은 색다른 질문을 던졌다.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보통 우리는 좋은 일자리냐, 나쁜 일자리냐를 구분하지 않고 '일자리가 많다', 아니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 언론에서도 늘 일자리가 몇 프로 늘었다, 줄었다며 양적 수치만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관성에 제동을 건다. 과연 그 질문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적절한 질문이냐는 것이다. 우리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3D업종 등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이 부족해 인력난에 허덕인다.
반면, 저자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을 예로 들며,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일하기에 숫자로 보면 완전고용 상태라고 말한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으니 길거리에 나가 밤새 만든 목공품이라도 내다 팔아야 하기에 숫자상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은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저자는 "왜 일자리는 부족한가"가 아니라, "왜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가"로 질문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양적 일자리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불균형한 노동시장도, 아프리카 마을의 가난도 설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을 공급과 수요가 만나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그렇기에 실업 등 모든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일자리는 남아돌지만, 실업률은 치솟는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일자리, 즉 인간이 노동하는 자리가 단순히 일하는 시간이나 임금으로만 규정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일을 하면서 존중받을 수 있는지,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지 등도 주요한 일자리의 가치가 된다. 이를 충족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이고 이러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일자리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저자는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런 의문에 답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시장의 논리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확산하는 지금의 구조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일자리는 시장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좀더 노동의 효율성을 낼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업 이익은 극대화되는 시스템이다. 이건 기업이 노동자를 억압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아니다. 기업이 제안하고 노동자가 받아들이면서 성립된다. 수요와 공급인 셈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좋은 일자리인지는 의문이다. 저자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인 '목소리', '존중', '소득'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적용받지 않기에 일하는 시간도, 임금도 자유롭다. 반면, 목소리를 낼, 즉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도, 일에 대한 존중도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 지면은 이들의 죽음으로 채워진다.
저자는 "20세기 이후 기술 변화가 일자리의 총량을 줄이지는 않았다"면서도 "중간 일자리는 없어지고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로 양극화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내리막길이라는 점이다. 저자는 이제라도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나쁜 일자리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한다. 기여적 정의의 재구성, 산업정책, 기술정책, 서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 나쁜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 정책, 교육훈련 투자 등.
저자는 일자리를 노동이나 고용으로 보지 말 것을 주문한다. 좁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노동이나 고용이 아닌 일, 그리고 사람과 삶의 문제라는 것이다.
”일의 세계는 쉬지 않고 변하는데, 우리는 같은 질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이 책의 질문은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이다,“(1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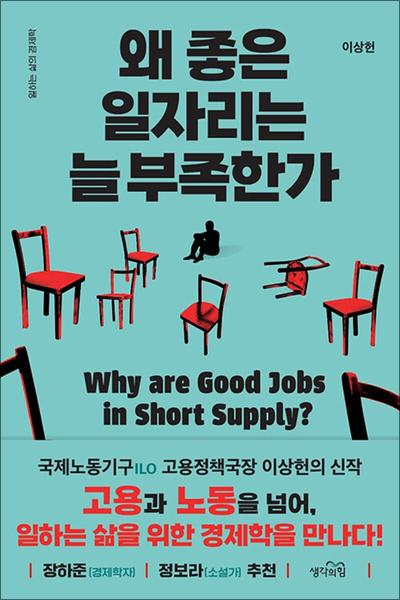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