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明山影多
綠陰白煙起
芳草兩三家
넓은 들에 저녁빛 엷게 내리고
맑은 물에 산그림자 가득하네.
녹음에 하얀 연기 일고
풀언덕에 집이 두어 채.
"이 시는 한음 선생님께서 열네 살 때 쓰셨답니다."
한음 이덕형의 집 사랑이었다. 허균이 낯선 선비 한 사람과 함께 먼저 당도해 있다가 유정과 허성을 맞았다. 유정이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한쪽 벽에 걸린 족자를 읽어 내려갔다. 허균이 글자를 다시 짚으며 설명을 보탰다.
"조선에 글 잘 하기로 이름 높은 분으로 봉래(蓬萊) 선생이 계셨지요. 저도 나중에 소문으로만 들은 일입니다만, 한음 선생이 어릴 때 영의정을 지내시던 외숙부 유전 상공의 포천 집에서 지내면서 봉래 선생을 만났는데. 봉래 선생이 먼저 시를 쓰시자 어린 한음 선생이 이 시로 화답을 했답니다. 이 시를 보신 봉래 선생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나도 들은 기억이 나는군. 봉래 선생이 이 시를 보시고 '너는 내 맞수가 아니라 내 스승이다' 하셨다는 거지. 봉래 선생 하면, 안평대군에 견주는 명필인데다가 글 재주 또한 비상하다고 소문난 분이신데, 그런 분이 열네 살 난 한음 선생이 쓴 화답시를 보고 맞수도 더 지나 스승이라 말씀하셨으니 아무리 듣기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라 해도 이 시가 보통은 넘는다는 얘기지."
허성의 맞장구였다.
봉래는 저 유명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하는 명시조를 남긴 명필 양사언의 호였다. 그런 사람이 어린 이덕형의 시재(詩才)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는 거였다.
유정이 서 있는 통에 일어나서 앉지 못하고 있던 낯선 선비가 이덕형의 시를 낮게 읊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평(詩評)이라면 교산만한 분이 없으신데, 교산이 보시기에도 이 시가 그처럼 대단한가요?"
"제가 한음 선생님의 시를 감히 어떻게 평하겠습니까. 봉래 선생께서 먼저 쓰신 시를 함께 본다면 좋겠습니다만, 이 시는 우선 각 시행에서 앞 두 글자와 뒤의 세 글자가 기가 막히게 둘셋으로 운율이 맞고, 저녁 나절 한때의 오묘한 경치를 눈앞에 있는 듯 그리면서도 그것에 쉽게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네 살 어린 연치로는 대단한 경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허균의 이름은 문장으로 널리 퍼져 있었지만, 왜란 중이던 스물다섯에 동시대에 활약하는 문인들의 시를 평한 시평집을 낸 바 있었다. <학산초담(鶴山樵談)>이라는 이름의 이 시평집에서 허균은 최경창, 백광훈, 이달 셋을 3당파라 이르며 조선에서 빼어난 당시풍 시인으로 설명하고 그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을 손곡 이달로 평가해 놓았다.
뒷날의 일이 되지만 마흔셋 때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평집 <성수시화(惺叟詩話)>도 내게 된다.
이덕형이 퇴청해 사랑으로 들어서다가 자신이 청한 손님들이 자신의 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소리를 내서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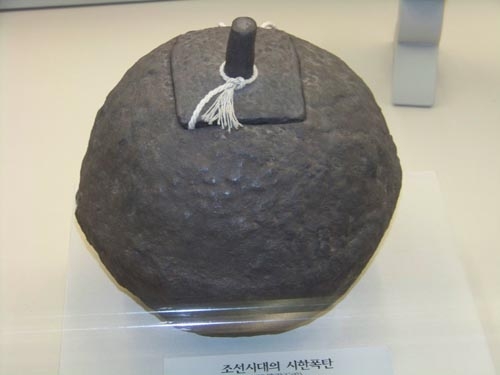
|
"제 시재가 어떤지 궁금들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송운 큰스님을 왜로 보내드리게 되어 전별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덕형은 서로 모르는 손님들을 소개하지도 않고 지필묵부터 대령케 했다.
"왜란 때 스님이 전공을 세운 걸 두고 율시를 쓴 적도 있지만, 미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노구를 이끌고 도일하시게 되었으니 제가 새로운 율시로써 보답코자 합니다."
지필묵이 마련되자 이덕형은 즉시 칠언율시 한 편을 써내려 갔다. 그러더니 그 시를 유정에게 전하지 않고, 허균이 볼 수 있도록 종이를 좌중으로 들이밀었다.
"교산, 이 시를 한 번 평해 주게나. 교산한테 시평을 받고자 오늘 이리 부른 거라네."
영의정 이덕형의 시를 면전에서 평가해야 하는 터라 허균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머뭇거렸다.
"저는, 송운 큰스님이 도일하게 되었다 해서 걱정만 하고 있었을 뿐...... 영상 대감처럼 전별시로써 위무해 드린다는 생각에는 아직 꿈결로도 이르지 못한 터라......"
"허허허, 교산이 내 시를 두고 머뭇거리는 걸 보니 내 시가 그리 운치가 없다는 뜻일 테지요, 큰스님?"
유정이 얼른 대답했다.
"그럴 리가요. 연전에 영상께서 저한테 주신 시도 제가 보물처럼 잘 갈무리하고 있는데, 또 금언을 주시는군요."
이덕형은 자신이 쓴 시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한쪽으로 밀어냈다. 이덕형이 노린 것은 허균의 시평도 아니었고, 유정의 사례 인사도 아니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시를 써 보이는 일 자체로써, 이제 도일하게 된 유정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려는 의도였다. 이덕형의 장점은 바로 이런 데 있었다.
"여기 오신 예조참판 허성 대감은 왜란 전에 일본에 다녀오셔서 일본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이덕형은 일부러 뜸을 들이듯 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을 여기 모셨습니다."
낯선 선비가 일어나 유정과 허성을 향해 읍을 했다.
"저는 전라도 남원에서 온 강항이라고 하옵니다. 정유년 재란 때 일본으로 잡혀가서 2년여 만에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돌아온 죄인입니다."
"아니, 그대가 수은(睡隱)이란 말인가!"
허성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수은 강항. 한때 벼슬이 형조좌랑에까지 오른 인물이라, 허성과도 몇 차례 부딪친 적이 있었다. 그 뒤로 왜국에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지만 만나지 못했다. 오랜 세월이 흐르기도 했지만, 강항의 체모(體貌)가 달라도 너무 달라져 있었다. 서른 후반 나이로, 거의 이십년 연상인 자신보다 더 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은 죄가 많아서 키가 줄고 몰골이 형편없어졌습니다."
강항은 정유년에 재침해온 왜군들을 상대로 맞싸우다 가족들과 함께 붙잡혀 왜국에서 2년 간 포로로 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었다. 적지에 있는 동안 놀랍게도 몇 차례나 적정을 세세히 살핀 편지를 써서 몰래 조선의 임금에게 보내왔다. 유정도 그런 충정을 이덕형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강공 존함은 일찍부터 듣고 흠모해 왔습니다. 오늘 뵈니 이 늙은 몸에서 힘이 솟는 듯합니다."
"큰스님에게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그나마 제가 지은 죄를 조금 갚을 수 있겠습니다."
이덕형은 일일이 술잔을 채워서 좌중을 부드럽게 이끌었다.
"강공은 왜국에서 돌아온 후 한때 나한테 와서 '예부절왜서(禮部絶倭書)를 초하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향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임금님께서 누차 벼슬을 내리시는데도 마다하고 두문불출입니다. 한데 큰스님께서 왜로 가시게 되어 청했더니 일부러 이렇게 상경해줬어요."
"작은 일 하나라도 말씀을 주시면 크게 도움 되겠습니다."
유정은 강항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강항이 몸을 일으켜 절을 올리듯이 숙여왔다.
"왜국이 하는 일이 다 천박하여 본받을 게 없지만, 중요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승려들에게 묻고 의지하는 풍습만은 놀라웠습니다. 더구나 장수나 병졸이나 글자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승려들은 제법 문자에 능통하여 제가 승려들과는 마음을 터놓고 말을 나누었습니다. 큰스님이 왜국에 가신다면 칼을 숭상하는 그들이라 해도 큰스님의 인품과 문장에 감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찬입니다. 강공."
"큰스님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왜국에서 도망쳐 나온 뒤 고향에 머물면서 기억을 떠올려 쓴 적국 이야기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강항은 소매 안에서 두루마리로 된 종이를 꺼내 놓았다.
"오호, 과연! 나도 여기, 조정에서 며칠 옛 문서를 뒤져 강공이 난 중에 왜국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몰래 올린 서찰을 필사해 왔습니다. 큰스님께서 이걸 보시면 왜국의 정세를 바르게 살펴 오시는 데 큰 도움이 될 듯싶은데요."
이덕형도 퇴청 길에 가져온 보퉁이를 풀어 놓았다.
"영상께서 이렇게 깊이 마음을 써주시니 뱃길도 순조로울 터이고, 왜국에 가서도 외롭지 않겠습니다."
유정이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강항의 쓴 글들을 조심스럽게 들추어 보았다.
'적중봉소(賊中奉疏)'라 쓴 글자가 본 강항의 몸이 움찔했다. 비록 자신의 필치는 아니었지만, 왜국의 차디찬 움막에서 피를 토하듯 고국의 임금께 바치는 글을 쓸 때의 뼈아픈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났다.
(이 소설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연재됩니다)
* 이 소설을 무단으로 다른 사이트로 옮겨 가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