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소설은 뜻밖에도 밀란 쿤데라의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배신'이나 '매혹' 등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성격화된 캐릭터들, 여주인공 류의 서사가 마치 우연하고 부수적인 에피소드인 양 스쳐가듯 처리된 방식, 증오와 복수의 비장함이 코미디로 뒤바뀌어 웃지 못할 희비극을 연출하는 광경 등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불멸>과 <농담> 등을 한꺼번에 연상시킨다.
작가도 굳이 숨기지 않은 이런 차용과 인유 등은 쿤데라 소설들에 대한 오마주처럼 보이기도 한다. 은희경과 쿤데라라니 첫눈에는 그리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이제는 브랜드가 된 은희경 소설 특유의 쿨한 냉소와 세련된 허무가 어쩌면 진작부터 쿤데라적인 것의 은희경 버전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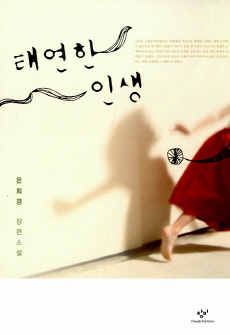
|
| ▲ <태연한 인생>(은희경 지음, 창비 펴냄). ⓒ창비 |
스토리 자체와 텍스트의 분량 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요셉의 서사이지만, 이 소설을 추동하는 것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류의 테마이다. 서두와 결말에 배치된 류의 부모의 첫 만남 이야기는 소설 전체를 품어 안듯 감싸고 있으며,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류의 존재가 요셉의 욕망과 행위 등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소설의 상당부분을 이루는 요셉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류의 이미지에 종속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 소설은 꽤나 지루하고 지리멸렬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시작되고 끝나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도 그들의 삶이 태연히 계속되는 모습 등은 요약적으로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는 소설 전체를 떠받치는 중심 테마이자 기하학적 구도의 역할을 한다. 류의 아버지가 강렬하고 한시적인 '매혹'의 세계, 빛을 발하다 스러져가는 '이미지'의 세계를 대표한다면, 류의 어머니는 질서 있게 지속되는 '패턴'의 세계, 고요하고 안정되게 흘러가는 '서사'의 세계를 표상한다. 이들 세계는 각각 '고독'과 '고통'의 테마를 동반한다.
"서사의 세계에 속하지 않았던 류의 아버지는 단독자인 셈이었다. 고독은 피할 수 없었다. 반대로 류의 어머니는 서사의 세계를 택했고 그 부조리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여야 했다." (17쪽)
그러나 이 두 세계는 캐릭터나 삶의 방식을 가르는 유형화된 틀에 머무르지 않고, 소설이 진행될수록 점차 겹치고 맞물리고 뒤섞이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세계와 어머니의 세계를 절반씩 물려받은 류에게 그 두 세계는 단절된 별개의 것일 수 없다. 류는 "어머니의 흐름에 몸을 실"은 채 고통스러운 감정과 욕망들 속을 통과해왔으며, 동시에 "아버지가 물려준 매혹의 세계"로 인해 생의 "고독을 견디"어왔다.
흥미롭게도, 류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캐릭터로 보이는 요셉 또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류는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 그에게서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를 보았다." 실제로 요셉은 패턴의 세계를 경멸하고 부단히 저항하지만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류라는 매혹의 세계에 몸을 던지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실 앞에서 "실패한 모험을 마치고 자신이 믿지 않는 것들 속으로 천연덕스럽게" 되돌아간다.
심지어 류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조차도 그 틀 속에 고스란히 머무르지 않는다. 연극 속 배역을 충실히 수행하듯 "많은 순간 자신을 배우로 바꿔서 고통 속을 통과해나가"다가 불현듯 극장으로 달려가 영화가 아닌 스크린을 응시하며 왼쪽 가슴 아래의 "원심분리기"를 돌려 "고통을 추출"하곤 했던 류의 어머니에게 "그 침전물이 고통이 아니라 고독이었다는 걸" 류는 뒤늦게야 깨닫는다. 그녀의 어머니에게 "상실은 고통의 형태로 찾아와서 고독의 방식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한편 "남의 나라에 태어난 소년"처럼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원하며 그것을 상실이라 불렀"던 그녀의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매혹을 보아버린 뒤"로는 모든 것이 "상실이라는 이름의 풍경"일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도 "고통은 관계의 고독이고 고독은 개인됨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태연한 인생>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기 몫의 고통과 고독에 대응하고 그것을 수락하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그려 보인다. 류는 상실과 환멸의 한복판에서 "그 시간 너머"를 보았던 어머니와는 달리 매혹과 열정의 정점에서 그 너머의 세계를 보고, "자기기만의 부역보다는 상실을 택"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테마를 만들어간다.
요셉은 상실 이후의 어느 한 시간에, "문을 열면 거기에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 너머가 있다는 걸 깨"닫고는 그 너머의 세계가 아닌 곳으로 몸을 돌리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이어나간다.
요셉을 따르는 돈 많고 '헤픈' 유부녀 도경, 트로트 가사를 빌어 "같이 있으면 고통 혼자 있으면 고독"이라 말하는 그녀조차도 어쩌면 자기만의 스타일로 두 세계를 연결하여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그 방식들 속에, 일반화될 수 없는 "고통의 고유성"과 고독의 고유성이 깃들어 있다고 이 소설은 말한다. 그저 통속적이고 별다를 것 없는 '태연한 인생'들이라도 그 어떤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으며,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가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개인의 고유함" 때문이 아니겠냐고. 쿤데라의 소설을 읽고 나서 종종 그러했듯 이제 책장을 덮으면서 패턴의 세계와 매혹의 세계, 고통의 서사와 고독의 노래를 엮어 짜는 나의 스타일은 어떠한지 생각에 잠겨도 좋은 시간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