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처음 발행된 웹진 <연극in>은 지난 12년 동안 한국 연극계와 공연예술계를 대표해온 상징적인 저널이었다. 그러나 서울문화재단 대표와 경영진이 바뀐 지금,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일방적 진단을 받고 폐간 절차를 밟고 있다. 웹진 <연극in> 폐간 대책위원회는 기고를 통해 공연예술의 언어와 기억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편집자
<연극in> 뉴스레터를 받아보지 못한 지도 1년이 넘었다. <연극in> 은 혜화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서울연극센터에서 운영하던 웹진으로,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극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쓰고, 편집하여 격주로 발행됐다. 보는 사람도 적고 만드는 사람도 적고 그 둘이 겹치는 경우도 많은 연극계에서 <연극in>은 극장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던 유일무이한 매체였다.
<연극in>은 대화, 리뷰, 기획, 현장, 희곡 등의 코너로 구성돼 있었다. 그중 내가 가장 좋아했던 코너는 대화 코너였다. 한 연극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그중에는 작가, 연출가, 배우처럼 무대 위에서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공연기획자나 무대감독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극을 만드는 사람, 극장의 청소노동자나 경비노동자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연극은 보거나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또한 음성해설 작가나 수어통역사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됐다. 연극 한 편을 만드는 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니. 연극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객석에 앉아 그 사람들의 손길을 떠올리다 보면 연극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알게 된다.
리뷰 코너에는 내가 본 공연과 보지 못한 공연의 리뷰가 실렸다. 공연예술은 발생하는 동시에 소멸하는 시간예술이기에 리뷰의 존재가 절대적이다. 어떤 공연은 그 리뷰로 기억된다. 내가 관람한 공연이더라도, 그 공연에 대해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공연 러닝타임의 갑절이 되는 시간을 들여 쓴 리뷰를 읽다 보면, 잊고 있던 아름다운 순간들이 떠오르거나 공연을 볼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의미를 갑자기 깨닫게 되기도 한다.
리뷰를 읽고 그 공연이 더 좋아진 적도 있다. 좋거나 싫다는 단순한 감상에서 더 나아가 좋은 게 왜 좋은지, 싫은 게 왜 싫은지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연극in>에 빚진 바가 크다. 공연 기간이 너무 짧거나 같은 기간에 더 보고 싶은 공연이 있어 관람하지 못한 공연의 리뷰 또한 <연극in>에서 읽을 수 있었다.
<연극in>이 아니면 리뷰를 찾기 어려운 공연도 많았다. 처음 보는 이름의 신진 예술가나 제도권 밖에서 자신만의 언어를 찾아가는 창작자의 작업을 리뷰를 통해 처음 만났다. 그렇게 나는 <연극in>을 통해 습관과 취향 너머를 탐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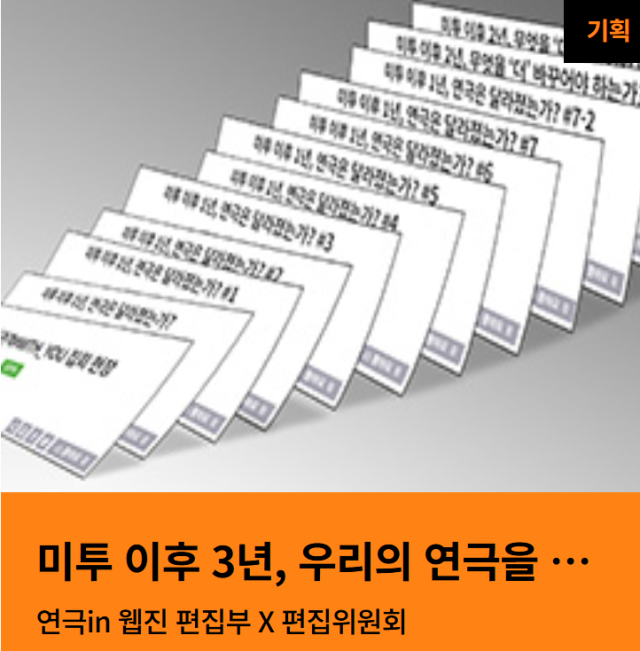
개별 창작자나 작품을 넘어서는 연극계 담론은 기획 코너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 주제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연극 읽기: 장애의 경험과 관점,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부와 추동의 힘으로 (미투) '이후'의 이후를 다시 쓰기", "연극인의 커리어: 어떻게 연극하고 있나요?" 등 연극계의 중요한 현안으로 바뀌었다. <연극in>의 기획은 연극계의 변화를 맥락 안에 위치시키고 설문조사나 좌담회를 통해 그 변화를 사람들의 목소리로 살아 움직이게 했다.
연극이 아니었다면 만날 일이 없었을 사람들이 하룻밤 극장에 모여 같은 연극을 보듯, 극장 안에서의 자리도 각자 하는 일도 다른 사람들이 <연극in>을 통해 생각을 나눴다. <연극in>은 우리를 느슨하게 이어주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다.
나 역시 연극계 미투 이후 연극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연극계와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획 기사 "미투 이후 1년, 연극은 달라졌는가?"의 관객 좌담회 패널로 초대된 적이 있다. <연극in>에 실리는 것은 연극을 처음 보기 시작했던 고등학생 시절부터 나의 오랜 꿈이었기에 그 초대가 부담스러웠던 만큼이나 기뻤던 기억이 난다.
불 꺼진 객석에 익명의 존재로 앉아 있던 나에게 <연극in>의 호명은 관객인 나도 연극의 일부라는 감각을 일깨워주었다. 그 감각이 나중에 직업이 관객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1인극을 직접 쓰고 공연하도록 이끌었다.
신촌의 한 작은 극장에서 단 사흘간 공연했던 그 1인극의 유일한 리뷰도 <연극in> 리뷰였다. 연극과 전혀 관련 없는 직업을 갖게 된 지금도 일이 힘들 때면 종종 그 리뷰를 찾아 읽고는 한다. 나 말고도 그 연극을 기억해주는 글이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된다.
그 1인극을 올린 뒤에는 대화 코너에서 인터뷰도 하게 됐다. 연극의 일부를 넘어 창작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극in>이 나를 창작자로 인정해 준 셈이다. 그렇게 연극 주체의 지형을 다시 그리던 <연극in>이, 그 안에 울리던 목소리들이 그립다. 폐간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대화를 읽을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공연을 보고 나서 <연극in>에 그 공연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검색해본다. 짧게는 일 년, 길게는 십 년도 더 된 대화이지만, 그 글을 읽다 보면 오늘 공연을 보며 가졌던 막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한다.
<연극in>에 쌓인 기록들은 시간의 간극을 건너 나에게 말을 건넨다. <연극in>이 사라진 동안의 공연들은 누가 기억하고 증언해 줄까. <연극in>이 없는 미래는 여전히 상상하기 어렵다. 그 안에 모였던 목소리들이 다시 이어지기를 바란다.



전체댓글 0